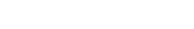이달의 책

 club k’s life
club k’s life  club k's book
club k's book  이달의 책
이달의 책염치와 수치.김남일. 낮은산?
잊고 살았다. 몸소 겪은 일이 아니었으니 그럴 만도 했지만 그래도 교과서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이름들을 다시 눈앞에서 만나보니 새삼스럽다. 더구나 그들은 한국의 문학 역사에 있어 근대를 상징하는 이들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그네들이 지나온 근대는 불행하게도 일제 식민지의 시간과 겹쳐진다. 식민지와 근대는 그리 어울리는 쌍은 아니다. 그러기에 더욱 문제적이다. 나라의 주권이 바뀐 혼동의 시대를 감당하던 문학인들의 이면이 적나라하다.
일본에서는 소설가 나쓰메 소세키가, 그리고 또 다른 식민지였던 중국의 문인 루쉰이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동아시아의 근대를 헤쳐나가고 있을 때 우리 땅의 문학에서, 문학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별처럼 쟁쟁한 이름들이 새로운 형식의 소설과 시를 써 이전의 문학과는 다른 길을 개척했다는 사실들만 들었지 그들이 빗어낸 일상의 민낯은 생소하다. 그들도 문학가이기 이전에 인간이었다. 그것을 자주 깜빡한다.
<메밀꽃 필 무렵>을 쓴 이효석은 잠시 조선총독부에 근무했던 사실이 평생 그 뒤를 따라다녔고, 한때 망명지인 상하이에서 <독립신문>의 사장까지 지낸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을 쓴 뒤 조선총독부의 개가 되었다는 지탄을 받았다. <태평천하>의 채만식은 조선인 징병제도가 실시되자 일본 천황의 성은에 감읍하는 글을 쓰던 때, 이육사는 일본 경찰에 몇 차례나 붙잡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의 수형 번호 264가 그의 필명이 되었다는 것도 이제 알았다. 감옥에서 참혹하게 주검으로 돌아온 그가 남긴 것은 만년필 한 개와 ‘광야’를 포함한 시 몇 편이 전부였다. 비료공장에 다니며 이른바 노동소설을 쓰던 이순익이 있었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도 가난 때문에 기침을 무릅쓰고 밤새 번역을 하고 소설을 쓰던 폐병쟁이 김유정이 있었다. 현진건, 염상섭, 심훈, 정지용, 임화... 참 많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암울한 근대를 견뎌내는 중이었다. 그리고 까마득히 잊었던 이름, 김명순과 나혜석.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여성 작가로 불리는 김명순. 이른 나이에 소설을 써 필명을 날린다. 그러나 그녀의 뒤를 따라다닌 건 추악하고 비열한 모략과 낙인이었다. 데이트 성폭력을 당하고도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정조가 문란한 신여성으로 손가락질당했다. 나혜석만이 여자에게 정조를 요구하려면 남자도 정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소위 대표적 남성작가로 불리는 이들은 비평이 아닌 비난으로, 때론 노골적인 글을 써 김명순에게 주홍글씨를 새겼다. 당시 가장 개화한 지식인이었던 그들마저도 김명순과 나혜석은 작가가 아닌 한낮 ‘여류’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유언’이란 시를 써 그런 조선에게, 조선의 ‘남류’에게 절규한다.
부제에서 보듯 한국 근대문학의 풍경은 “때론 비루하고, 때론 민망하고, 때론 억장이 무너졌다. 때로 화가 났고, 대가 기가 막혔다.” 어느 시대든 기록으로 남은 자들의 역사가 전부는 아니다. 우리의 근대도 그렇고 근대의 문학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대로변의 풍경이 자주 뒷골목의 실체를 가린다. 왜곡과 은폐는 우리의 근대문학에도 만연했던 것. 이제라도 그녀의, 그들의 이름이 밝혀져 다행이다.
[클럽케이서울 신상웅 북 큐레이터]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공부했다. 2016년 서울과 청주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동아시아의 쪽 염색을 찾아다닌 책 [쪽빛으로 난 길]을 냈다.염색을 하며 틈틈이 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