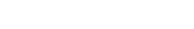이달의 책

 club k’s life
club k’s life  club k's book
club k's book  이달의 책
이달의 책문학의 선율, 음악의 서술. 위화. 푸른숲
예술로서의 문학은 어디에서 자양분을 길어 올리고 스스로 꽃을 피우는가. 중국 영화배우 공리 주연의 모태가 된 소설 『인생』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파는 한 평범한 사내의 이야기를 담은 『허삼관 매혈기』의 작가 위화余華가 읽은 책과 들은 음악에 대한 기록이 이 책에 빼곡하다. 독서나 감상의 평범한 기록이 아니다. 추천의 글에서처럼 ‘생을 헐어 쓴’ 한 작가의 통찰이 빛난다.
‘내가 보기에 루쉰과 보르헤스는 문학에서 명확하고 기민한 사유를 상징하는 작가이다. 루쉰은 우뚝 솟은 산맥처럼 드러내고 보르헤스는 강물처럼 깊이 파고들면서, 두 사람은 일목요연하게 사유를 제시하는 동시에 사유의 두 가지 존재 방식을 보여준다.
문학에서 어떤 사람이 전율을 일으키는 대낮이라면 다른 어떤 사람은 불안을 야기하는 밤과 같다. 전자가 전사라면 후자는 몽상가이다.’
위화는 지난 시간의 연대기에서 명멸한 수많은 위대한 작가들의 명단에 자신의 선배 작가인 루쉰의 이름을 올려놓는다. 그건 같은 민족의 범위에 속한 속 좁은 애정이 아니다. 작가로서 루쉰이 보여주는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그만의 경탄할만한 문학 적 견해에 동감하기 때문이다. 위화가 보기에 ‘그의 서술은 현실과 맞닿을 때 총탄이 몸에 남는 게 아니라 그대로 뚫고 지나가듯 순간적이면서 강렬하다’.
일본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카프카의 이름을 나란히 두며 위화는 그렇게 루쉰을 지나 안톤 체호프와 아랍의 길고 긴 이야기 『아라비안 나이트』에 가닿는다. 슈테판 츠바이크와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소련의 극작가 불가코프까지. 그리고 문학의 뒤를 브람스와 바그너와 쇼스타코비치가 채운다. 책의 제목처럼 위화는 문학에서 음악적 선율을, 음악에서는 문학적 서술을 이끌어 낸다. 그러니 루쉰에서 불가코프에 이르는 이름을 겨우 언급한 이 서평은 책의 반쪽만을 들여다본 셈이다. 문학과 음악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사유의 폭이라니. 감동을 주는 작품이 거저 나오는 경우는 없다.
[클럽케이서울 신상웅 북 큐레이터]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공부했다. 2016년 서울과 청주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동아시아의 쪽 염색을 찾아다닌 책 [쪽빛으로 난 길]을 냈다.
염색을 하며 틈틈이 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