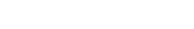이달의 책

 club k’s life
club k’s life  club k's book
club k's book  이달의 책
이달의 책창을 순례하다
당신은 집이나 쇼핑몰 혹은 사찰이나 교회 등의 건축물을 볼 때 무심코 어디를 처음 보는지 기억하는가. 당연히 취향에 따라 제일 먼저 시선이 닿은 곳은 저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지붕을 먼저 볼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발걸음이 가장 먼저 향하는 현관에 눈이 먼저 갈 수도 있겠다. 개인의 미적 취향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습관에서 오는 무의식일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창 혹은 창문은 어떤가.
건물 밖에서든, 혹은 그 안에 들어가서 창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가. 그동안 잊고 있었다면 지금 주위를 둘러보거나 거리로 나가보라. 거리의 풍경을 특징짓는 곳이 건물의 어디인지. 이 책은 세상의 거의 모든 창에 관한 이야기다. 지은이는 창은 건물과 거리의 얼굴이라고 말한다. 거리의 표정이 창에 의해 구별되고
생동한다는 것을 세계 곳곳에 모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창을 통해 설득력 있게 증명한다.
창은 빛을 받아들인다. 창으로 밖의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고 실내의 탁한 공기를 밖으로 순환시킨다. 창은 빛과 바람과 공기와 함께 창밖의 풍경을 끌어들인다. 창은 안이면서 동시에 밖이고 둘 사이의 다리이자 경계가 되는 순간이다. 여기까지가 주로 사람이 거주하는 집의 경우라면 상업공간인 가게의 창은 그것과는
또 다른 역할이 있다. 지은이는 그를 일러 ‘일하는 창’이라 말한다. 아침에 창을 열면서 장사를 시작하고 창을 가운데 두고 판매대나 조리대나 작업대가 탄생한다. 그리하여 창은 쇼윈도이자 일터가 된다.
조용한 산사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은 부처가 모셔진 대웅전이다. 대웅전의 화려한 문을 ‘꽃문’이라 부른다. 그래서 누군가는 창을 건물의 꽃이라 불렀나 보다.
건물의 꽃은 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창은 단순히 건축의 구조물이 아니라 건축을 넘어 문화와 도시와 사람을 잇는 길이기도 하다. 열린 창으로 빛과
바람과 공기만 오가는 것이 아니다. ‘창窓’이라는 글자에 왜 ‘마음心’이 있겠는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창에 대한 다른 눈이 생긴다.
[클럽케이서울 신상웅 북 큐레이터]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공부했다. 2016년 서울과 청주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동아시아의 쪽 염색을 찾아다닌 책 [쪽빛으로 난 길]을 냈다.
염색을 하며 틈틈이 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