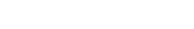이달의 책

 club k’s life
club k’s life  club k's book
club k's book  이달의 책
이달의 책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바다의 이야기다. 아니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에 관한 이야기다. 한 걸음 더 들여다 보면 바다의 생명들과 그것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라 부를 수 도 있겠다. 책갈피마다 바다의 짠내와 생선의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가장 많은 책을 저술한 인물로 널리 알려진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서해바다 끝 자락의 외딴 섬 흑산도에 유배 가서 쓴 물고기와 바다 식물의 백과사전인 <자산어보> 를 바닥에 깔고 밥상 위의 풍경을 적나라하게 풀어놓는다.
책을 읽다 보면 나도 갓 잡은 은빛 찬란한 갈치회가 먹고 싶어지며 듣도 보도 못한, 흉물스럽기 그지없어 보이는 군소는 어떤 맛인지 살짝 궁금해질 지경이다. 뼈째 썰어 이긴 마늘 섞어 만든 된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인 살진 병어가 어느 계절에 제맛인지 기억해 두는 것도 잊지 않는다. 혹 낚시엔 젬병이라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고둥이나 거북손을 찾아 바닷가 바위를 찬찬히 뒤지면 된다. 바다는 그렇게 부지런만 떤다면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을 언제든 내어준다. 어디 먹거리뿐이겠는가. 인생이 꼬이고 앞길이 막막할 때 바다를 찾아와 떠오르는 해나 지는 낙조를 보지 않은 이가 세상에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게 숨을 삭인 뒤 싱싱한 고등어 한 손 사 들고 돌아와 단단하고 매운 무 썰어 지져놓고 나면 삶이 별다를 것도 없다는 자신감으로 다시 사는 게 인생 아니던가.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란 젊은 선비 정약전이 절해고도의 섬 흑산도에 내렸을 때 그도 눈앞이 캄캄했을 것이다. 육지에서 배를 타고 한나절을 가야 닿을 수 있는 외딴 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한동안 두려움과 외로움에 치를 떨다 눈에 들어온 것이 사방에 지천으로 널린 바다로부터 오는 생명들이었던 것. 그렇게 그는 섬의 어부들에게 물어가며 <자산어보>를 썼다. 지은이 역시 갓 잡은 학꽁치를 저며 회 한 접시를 떠 놓거나 우럭 한 마리를 끓여 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한 손에는 <자산어보>를, 다른 한 손으론 소주잔을 들며 저녁을 마무리한다. 작가는 자신이 태어난 섬 거문도에서 살며 이 책을 지었다. 펄펄 뛰는 생선처럼 글에 생기가 도는 이유다.
[클럽케이서울 신상웅 북 큐레이터]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공부했다. 2016년 서울과 청주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동아시아의 쪽 염색을 찾아다닌 책 [쪽빛으로 난 길]을 냈다.
염색을 하며 틈틈이 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