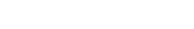이달의 책

 club k’s life
club k’s life  club k's book
club k's book  이달의 책
이달의 책작가님, 아디 살아요?
하와이를 시작으로 미국 보스턴 앞바다, 전갈 꼬리처럼 말아 올라간 육지 끝 프로빈스타운을 지나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향하는 길. <위대한 개츠비>의 피츠제럴드가 글을 쓰던 프랑스 바닷가의 휴양지와 네루다의 칠레를 돌아 터키 이스탄불로, 베트남 호치민으로 향하는 이 길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스물여섯 살의 조숙한 시인 랭보가 커피 무역을 하던 에티오피아의 고대도시 하라르로 가는 여정을 여행이라 부르지 않고 순례라 명명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나의 길이 아닌 타인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아주 느리고 조용한 길이므로.
순례란 마크 트웨인이 와이키키 해변의 파도에 몸을 던지던 순간, 또 시인 메리 올리버가 사랑한 연못 블랙워터 주위를 따라 걸으며 그들의 문학이 어디에서 왔을까 되새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반복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마드리드의 마요르 광장에서 샛길로 빠져 덥수룩한 수염의 헤밍웨이가 자주 찾아와 와인을 마시던 오래된 식당을 찾아 보는 일이며 프라하의 좁은 골목에서 길을 잃거나 뒤라스의 소설 <연인>의 배경인 호치민 차이나타운의 혼잡한 거리에 서서 열정의 조급함에 대해 곱씹어보는 일도 그에 속한다. 글을 쓰는 일이 아니라 글을 남긴 자들이 머물렀다 떠난 공간에 관한 이야기가 순례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있다. <백년의 고독>의 마르케스가 머물던 콜롬비아의 작은 도시몸포스 중 한 대목이다.
‘마을을 뒤덮은 나른한 기운은 낮 시간을 지배하는 무더위에 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해가 뜨면 격자무늬 치마 차림의 여학생들이 학교로 걸어갔고 밀짚모자를 쓴 남자들은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통나무배에서 내렸다. 몸포스는 한낮에 가장 조용하다. 길가에 박쥐들이 낮게 날아다니는 저녁때가 되면 주민들은 성모 수태 광장의 카페 틴토에 하나 둘 모여든다. 나도 그들과 함께 그곳 흔들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음반에서 흘러나오는 베토벤과 비발디를 들었다.'
낯선 어느 도시의 집과 길에서 앞서간 작가들의 고뇌와 직감과 설렘을 짐작하는 일은 그들보다 느리게 걷거나 그 자리에 멈추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생각을 생각하는 순례는 그래서 때론 여행보다 사치스럽다. 그래도 책장을 넘겨보시라. 혹시 아는가, 불현 듯 눈앞에 당신만의 순례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지.
[클럽케이서울 신상웅 북 큐레이터]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공부했다. 2016년 서울과 청주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동아시아의 쪽 염색을 찾아다닌 책 [쪽빛으로 난 길]을 냈다.
염색을 하며 틈틈이 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