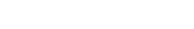이달의 책

 club k’s life
club k’s life  club k's book
club k's book  이달의 책
이달의 책디터 람스 :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
너무 익숙해 잊고 사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제법 많다. 물고기가 물을 잊듯, 사람들이 공기를 의식하지 않고 살 듯 말이다. 그렇다면 ‘디자인’은 어떤가. 물처럼, 공기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디자인된 공간에서, 디자인된 탁자와 의자에 앉아 보기 좋은 잔을 골라 커피나 차를 마신다. 어디 그뿐인가. 입고 있는 옷과 신발도 모두 디자인이란 이름을 달고 인간과 관계를 맺는다. 결국 디자인이란 개념은 생활 곳곳에서 은밀하게, 때론 가장 화려하게 눈에 띄는 방식으로 인간과 함께 진화한다.
여기 디터 람스Dieter Rams라는 디자이너가 있다. 시간을 소급해보자면 오래 전 사람이라서, 또 현업에서 은퇴한 이름이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브라운면도기’라고 하면 한번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책의 제목처럼 그는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라 불리는 인물이다. 말인즉 디터 람스의 이후의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를 존경하거나 적어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의 영향을 받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적도 시대도 맡은 역할도 제각각인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왜 주저 없이 늘 그의 이름을 디자인의 역사 위로 호명하는 것일까?
그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간추렸다. 혁신적이며, 아름답고, 정직하며, 재품을 유용하게 만들며,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 등 10개의 항목으로 자신이 디자인에 쏟은 열정을 차분하게 분석한다. 또 좋은 디자인이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첫눈에 반짝 관심을 끄는 디자인 보다 오래가는 미학을 통해 쓸수록 믿음을 주는 제품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 그러나 자신이 구체화한 10개의 디자인 철학에 골몰한다고 해서 예외 없이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잊지 않고 지적한 다. 새로운 디자인은 새로운 세대의 몫이라는 것이다.
책을 읽는 즐거움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보는 즐거움이란 무엇일가를 일깨워주는 데 한 몫을 하는 책이다. 디터 람스와 그의 디자인팀이 디자인하고 고른 100개의 제품을 보는 일은 그래서 덤이 아니라 이 책의 본론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는 여전히 그의 디자인 철학과 그를 바탕으로 탄생한 제품들을 통해 묻는다.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클럽케이서울 신상웅 북 큐레이터]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공부했다. 2016년 서울과 청주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동아시아의 쪽 염색을 찾아다닌 책 [쪽빛으로 난 길]을 냈다.
염색을 하며 틈틈이 글을 쓴다.